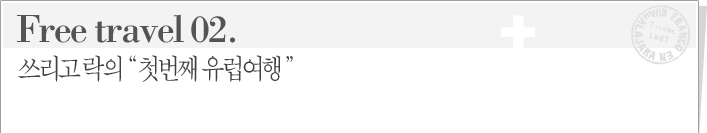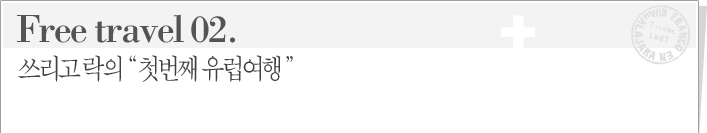|
케른트너 거리에 있는 음반샵에 갔는데 음반가격이 비싸서 구입은 하지 않았다. 보통 한장에 290실링이었는데 한국돈으로 약 27000원.
한국의 CD값이 얼마나 저렴한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유럽에 가서 진귀한 CD를 헌팅하려던 나의 계획은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수포로 돌아갔다.
케른트너 거리가 끝나자 곧바로 오페라 극장이 나왔고 이어 호프부르크 왕궁과 국회의사당, 시청사등 볼거리가 줄줄이 나왔다. 빈
역시 볼거리가 특정구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돌아다니기에는 좋은 도시였다.
이후 트램을 타고 다시 약간 이동하여 4번 지하철을 타고 쇤부른 궁전으로 향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이
자리한 그곳 역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중이었다. 나는 빈 카드로 10실링 할인을 받아 그랜드 투어를 했는데 할인된 가격이
125실링이었다. 그래도 막상 들어가본 쇤부른 궁전은 정말 입 딱 벌어지는 돈덩어리와 역사 그 자체였다. 아마 내가 눈으로 본것만
그 값이 수조원은 되지 않을까? 중세 유럽의 황제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실감이 갔다. 개인적으로 쇤부른 궁전의 티켓만큼은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화찬란함의 극치를 보려면 쇤부른 궁전에 가 보면 될 것이다.
쇤부른에서 꽤나 시간을 보낸후 배가 고파 슬슬 자리를 떴다. 빈에 왔으니 "비엔나 슈니첼"을 먹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레스토랑 여기저기의 가격을 보러 다니다가 결국 "Easy Europe"에 토막기사로
소개해 놓은 레스토랑을 찾아가기로 했다. 간판이 작아서 약간 찾기가 힘들었는데 "Ottaringer"란 자그만
간판을 단 그곳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보아하니 큰 번화가도 아닌듯 싶었는데 여행객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난 모양이었다.
나는 낯선 사람과 합석을 해야 했고 일단 비엔나 슈니첼과 샐러드, 그리고 맥주를 시켰다. 슈니첼이 68실링, 샐러드가 22실링,
그리고 맥주가 35실링이었다. 책자에 나온 가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리되어 나온 슈니첼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가 두개나 나왔다. 나는 먹다 먹다 다 못먹고 결국은 남기고 나왔다. 어지간한 어른이 가도 다 못먹고 나온다는 "이지유럽"의
설명은 사실이었다.
식사후 도나우 타워로 이동했다. 역에서 내려 약간 걸어야 했는데 찾기는 쉬웠지만 여자들은 혼자 가기가 약간 그럴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특히 밤에는 말이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길이 조금은 으슥하다고 할까? 여성 여행객들은 가능한 여럿이 함께 가는게
좋을 듯 싶다. 어쨌거나 거기서 빈 카드로 할인을 받아 티켓을 55실링에 구입한후 전망대에 올랐다. 거기서 보는 빈의 야경은
정말 멋졌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
도나우 타워의 레스토랑은 아래쪽과 위쪽 두개가 있는데 모두 360도로 회전을 한다. 위쪽의 좌석이 만땅이라서 나는 아래쪽에 갔는데
맥주와 샐러드를 시켜놓고 천천히 회전하면서 바뀌는 레스토랑의 유리 밖으로 빈의 야경을 감상했다. 신혼부부가 오면 분위기 끝내줄
그런 곳이 아닌가 싶다. 거기는 말이다...
1시간쯤 있다가 그냥 호텔로 돌아가기가 뭐해 다시 케른트너 거리로 갔다. 그 주위 여기저기를 하염없이 방황하며 빈의, 아니
유럽의 마지막 밤을 달랬다. 잠시후 호프부르크 궁전의 측면인듯 짐작되는 자그만 분수대가 있는 광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는 두명의
길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기타를 통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낯선 빈의 밤거리에 들리는 그 낭만적인 선율은 정말 야릇함
그 자체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각하며 그 낯선, 그렇지만 사색적이고
낭만적인 정취를 즐겼다.
그 순간, 아마도 내 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그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할까? 그렇게...아쉽게....빈의
밤은 저물어 갔다........ 나의 짧은 유럽에서의 시간과 함께..... |